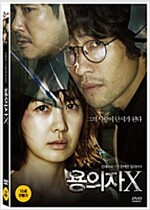숲노래 책빛 / 가난한 책읽기
이제서야 국가보안법 (+ 강제 십지 지문채취)
나는 ‘조진웅’이란 이름을 2025년 12월에 처음 듣는다. 나는 ‘박나래’가 나온 풀그림을 아예 본 일이 없지만 이름은 얼핏 들었다. 나는 ‘조세호’라는 이름을 스치듯 누가 말할 적에 들은 일은 있되,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1995년 12월에 싸움터(군대)에 들어갔더니, 나더러 ‘룰라’를 알겠다면서, ‘룰라 노래+춤’을 선보이라고 하더라. 새내기(신병)는 언제나 노리개였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룰라’가 뭔지, 사람이름인지 과자이름인지, 아니 뭘 가리키는 이름인지 못 알아들어서 멍하니 섰더니, 나한테 “야, 우리를 즐겁게 ‘룰라’ 좀 부르고 춰 봐!” 하고 읊던 윗내기(선임병)가 갑자기 날아들더니 옆차기로 가슴을 후려갈겨서 데굴데굴 굴렀다. 옆차기를 선보인 윗내기는 “이 ××가 대학물 좀 먹었다고 우리가 우습게 보여? 다 알면서 노래도 안 부르네?” 하면서 주먹을 곁들여 한참 두들겨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룰라’라는 이름이었으나, 그저 넋놓고 얻어맞으면서 견뎌야 할 뿐이다. 나는 책벌레였을 뿐이고, 보임틀(텔레비전)도 안 보는데, ‘룰라’이건 ‘콜라’이건 어찌 알겠나?
몇 해 뒤에 나는 윗내기가 되고, 나는 새내기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들(선임병·하사관·소대장·중대장)이 하듯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러던 어느 날 어느 새내기가 “최뱀(최 병장)은 어떻게 저희를 안 때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니,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에스이에스’가 부른 노래와 춤을 보여준 적 있다. 그러나 나는 ‘룰라’뿐 아니라 ‘에스이에스’가 뭔지, 사람이름인지 과자이름인지 알 턱이 없었다. 멍하니 듣고 보고서 새내기한테 물었다. “○○○ 이병, 그런데 에스이에스가 뭐지? 에스오에스하고 뭐가 달라?”
룰라도 에스이에스도 몰랐고, 싸움터를 마치고서 밖(사회)으로 돌아온 뒤에 ‘핑클’이 한참 뜬다고 했으나 또 무슨 소리인지, ‘에쵸티’라는 이름은 뭔지 그저 지끈지끈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이름은 있으니 ‘국보법(국가보안법)’이다. 이 나라는 일본에 서슬퍼렇게 찍어누를 때를 지나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잇는 사슬나라를 잇는 동안 ‘국보법’으로 재갈을 물렸고 주리를 틀었고 몽둥이찜질을 이었으며, 멀쩡한 사람을 마구 죽이고 괴롭히고 짓밟았다.
1997년 12월에 나라지기로 뽑힌 김대중 씨는 ‘국보법’을 없애겠노라 하다가, 김종필을 곁에 두면서 입씻이를 했다. 이러면서 주민등록증에 난데없이 ‘한자 섞어쓰기’를 밀어붙였고, ‘손그림 찍기(지문채취)’를 없앨 듯 떠들다가, 아주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2002년에 나라지기로 뽑힌 노무현 씨도 똑같다. 나라지기로 뽑히면 ‘국보법 없애기’를 하겠다고 외치더니만, 정작 나라지기 자리에 선 뒤에는 ‘자리지키기(권력유지)’를 하려면 국보법을 없애면 안 되겠더라고 말을 바꾸었다.
2008년 뒤로는 국보법 얘기가 물밑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래저래 말밥은 있되, ‘국보법이 안 사라졌’어도 이 나라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재갈을 물리거나 고삐를 채우는 일은 사라지는 듯했다. 오히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잇는 끄나풀’이 아닌 ‘김대중·노무현을 잇는 끄나풀’ 쪽에서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우듯 사람들 입을 틀어막는 바보짓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이른바 ‘팬덤정치·무당정치’가 튀어나왔다. 이러던 2025년 12월 7일 즈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슬그머니 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왜 난데없이 2025년에? 여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몹쓸 굴레는 걷어치워야 맞다. 그렇다면 국보법은 2024년에는 안 몹쓸 굴레였나? 2022년이나 2020년에는? 2019년이나 2018년에는? 2017년이나 2016년에는? 2015년이나 2014년에는?
오늘날 ‘민주당’은 민주하고 멀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등지고, ‘진보당’은 진보하고 담쌓고, ‘녹색당’은 푸른빛이 안 보인다고 느낀다. ‘조국혁신당’은 서울대 담벼락으로 입만 산 무리라고 느낀다. 뭘 없애야 할까? 열여덟 살 푸름이는 주민등록증을 받을 적에 ‘열손가락 손그림 찍기(십지 지문 채취)’를 해야 하는 몹쓸굴레가 아직 버젓한데, 이놈도 저놈도 그놈도 요놈도 이 대목을 안 쳐다본다. 그들 눈에는 어린이와 푸름이가 아예 안 보이는구나 싶다. ‘열손가락 손그림 찍기’는 ‘사납이(범죄자)’한테만 하는 일인데, 일본은 한겨레(재일조선인)한테 이 짓을 꼬박꼬박 했다. ‘재일조선인 강제 지문날인 폐지’를 놓고서 참으로 오래 싸워야 했고 드디어 1991년에 일본에서 걷어치운 얼뜬짓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룬 글은 참 드물고, 이 이야기를 아는 이웃도 참 적다. 더구나 일본조차 서른 해 앞서 내다버린 ‘강제 십지 지문채취’를 왜 우리는 2025년에도 멀쩡히(?) 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 손그림을 마구마구 받는다. 벼슬아치(국회의원·군의원·시의원) 따위는 뭘 하는가? 무엇부터 없애야겠는가? 그리고 국보법을 이제서야 없애겠노라 할 적에, 왜 뒤에 숨듯 몰래 하는가? 떳떳이 먼저 밝혀서 그동안 어느 대목이 어떻게 말썽이었는지 외쳐야 하지 않는가?
‘밀양성폭행사건’은 아직 안 끝난 생채기이다. ‘밀양성폭행사건 끄나풀’은 여태 뉘우친 바도, 값을 치른 바도 없기에, 앞으로도 그들은 톡톡히 값을 치르게 마련이다. 조진웅 씨는 지난일을 놓고서 어떻게 값을 치렀는지 모를 노릇이지만, 이녁 스스로 먼저 잘못과 말썽을 떳떳이 밝히거나 뉘우치면서 일을 했는지, 슬그머니 물타기처럼 감추고 가리고 숨기면서 허울만 높였는지 따져야 하지 않을까? ‘사회복귀’가 옳다면 ‘조두순’도 나란히 ‘사회복귀’를 해야겠지. ‘박근혜·이명박’도 사슬살이를 했으니 ‘사회복귀’를 나란히 봐줘야겠지. ‘쟤네’는 다 봐줄 수 없으면서 ‘이쪽(아군)’은 다 봐줘야 한다고 읊는다면, 그냥 창피한 노릇이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청소년 십지 지문 채취 폐지’를 함께 말하지 못 하는 ‘국보법 폐지’라면 얼마나 텅텅 속빈 깡통인지 민낯이 훅 드러나는 2025년 12월이다. 그러고 보니, 12월은 ‘무안공항 대참사’가 일어난 달인데, 여태 어떤 특검도 국정조사도 없을 뿐 아니라, ‘무안공함 대참사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민주인사·진보인사’나 ‘작가회의 선언’을 본 바도 들은 바도 없다. “현지 누나!”를 속삭인 ‘김남국’ 씨는 쇠고랑을 찰 수 있을까? 깜깜한 섣달 하루이다. 2025.12.8.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