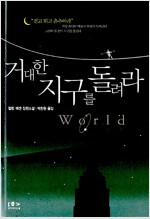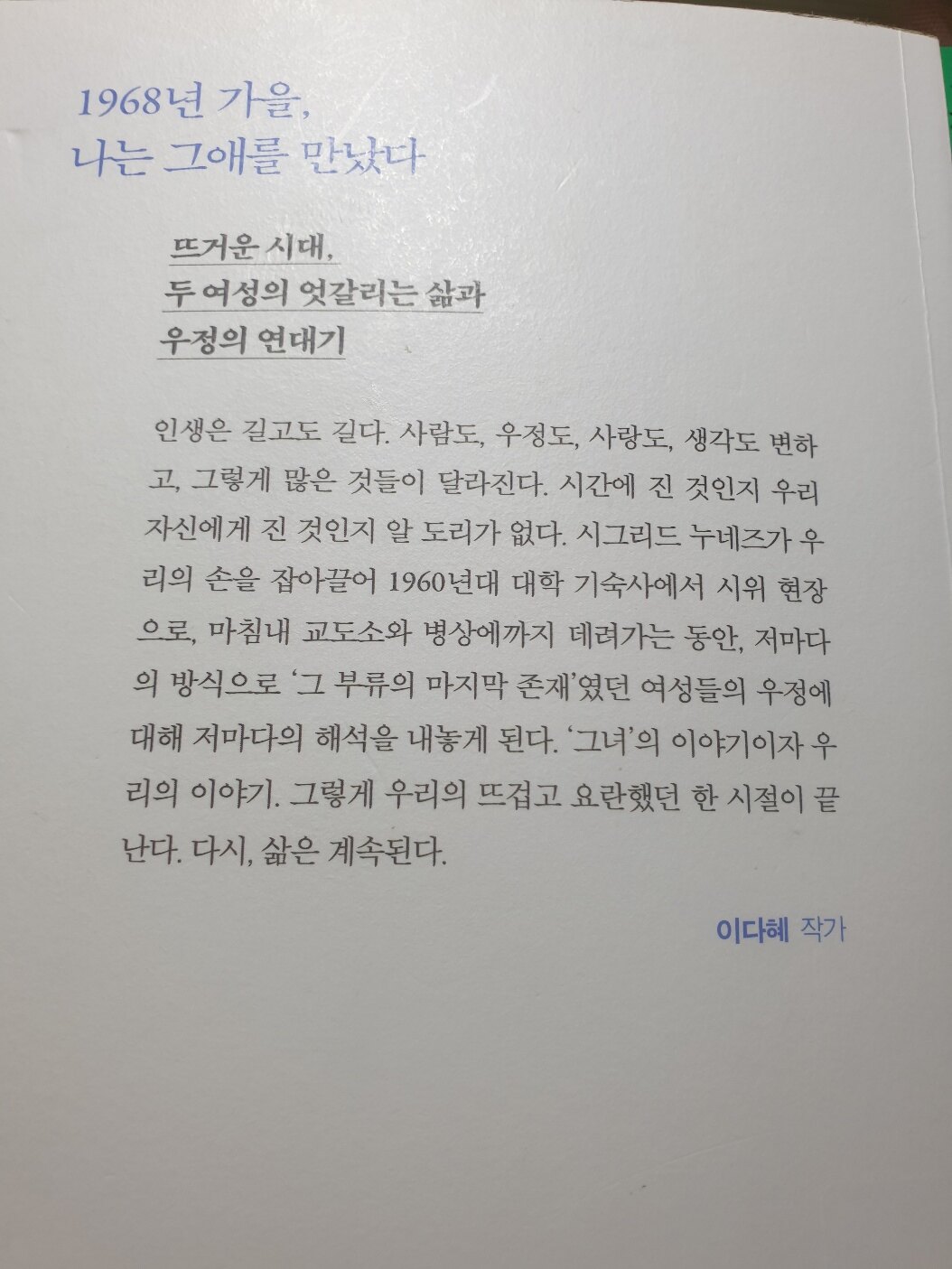1968년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느낀다. 비틀즈가 그런 혁명의 의미를 줄여놨다는 얘기를 목수정 책에선가 들은 기억.듣고보니 정말 비틀즈밖에 모르는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예전에 읽었던 거대한 지구를 돌려라도 전체적으로 70년대 미국을 훑어냈는데 이 책은 좀 그런의미로 60년대를 훑고 있다 아직 초반이라 그 부류의 존재를 아직 체감은 못 하고 있다.
이다혜의 붙임말도 좋은데 왠지 쓸쓸하고 그래서 또 좋고
책에 빨려들어 왜그럴까 생각해보면 작가의 글때문일수도 있겠으나 이런 느낌들은 번역일때가 내 경우엔 더 컸어서 역자를 보니 민승남 씨다. 번역작중 읽은 책이 시핑뉴스가 있네. 그러니 왠지 더 믿음이.
끝까지 좋았으면 하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