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완벽한 무인도
박해수 지음, 영서 그림 / 토닥스토리 / 2025년 7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가제본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

나의 완벽한 무인도/ 박해수 지음ㆍ영서 그림/ 토닥스토리/ 창비
다 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픈 이들의 손에 들려주고픈, 잔잔하지만 단단한 이야기를 만났다. 토닥스토리에서 출간 예정인 박해수 작가의 [나의 완벽한 무인도]는 작가가 바닷가 마을에서 생활하며 품었던 상상을 글로 풀어낸 작품이다. 주인공 차지안도, 작가 박해수도 결과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풍조에 지친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 듯 어느 날 문득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지안의 회복이 나의 일인 양.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치열한 사회에 지쳐버린 청춘이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강원도 바닷가로 향한다. 발길 닿는 대로 도착한 그곳에서 항구의 거친 파도 덕분에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건네준 따뜻한 국 한 그릇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차지안의 홀로서기, 차지안의 자신 찾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해수 작가는 삶의 큰 변화는 예기치 않게 불현듯 찾아오는 거라는 걸 담담하게 그려낸다. 지안은 갑자기 찾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뱃일을 배우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었다. 상세한 계획과 의도가 아닌 불쑥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은 것이다.
"저, 섬에서 혼자 살아볼래요."
도문항에서 연을 맺은 영일호 선장 오현주의 도움으로 무인도인 송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지안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고자 했는지,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야기 중간중간 꿈과 회상으로 그려진다. 단어 하나로 자신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당당히 외치던 지안이 어느새 몹시도 작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엄마의 편지 중, 232쪽)

지안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차츰 자신을 찾아간다. 느릿느릿. 사회, 타인의 속도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속도와 마음을 따라 하루를 채워나간다. 도시에서의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무인도의 일상은 지안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인도. 물도, 음식도, 길도 모두 직접 해결해야 했다. 자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다에서 먹거리를, 숲에서 장작을 구하고, 빗물을 받아 물을 모으고, 텃밭을 경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안을 조용히 응원하는 듯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초겨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섬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지안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 새벽 일찍부터 시작되는 그의 하루를 따라 걷다 보면 지안의 집이, 텃밭이, 바닷속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지안이 느끼는 바닷물의 온도차, 처음 본 여름밤 바닷속의 흥성거림, 그 여유를 감각하게 된다.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저릿하다. 상처 입고 움츠려든 자아를 감싸주는 따스한 온기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일보다 사람을 어려워한 지안이 무인도에서 자신을 찾아가려 마음먹은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교감, 교류가 아닌 고독을 택한 지안은 섬 생활에서 하나하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자신을 알아가고 채워나간다.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에서는 그 속도에 맞춰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는 조절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꼭 해야 할 일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나간다. 그 여유는 주변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지안이 소나무 숲을 걸으며 맡은 수많은 내음과 향처럼.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각자의 내음, 향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풍기는 냄새는 어떨까.
나는 앞으로 어떤 향을 만들며 살아갈까. "
지안이 갯바위를 걷다 주욱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것처럼 상처를 입는 일은 쉽다. 몸도, 마음도 쉽게 생채기가 생길 수 있다. 남들이 내는 상처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가진 적의는 더 깊고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지안은 곪은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상처 내지 않도록 단단히 여물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자긍심을 쌓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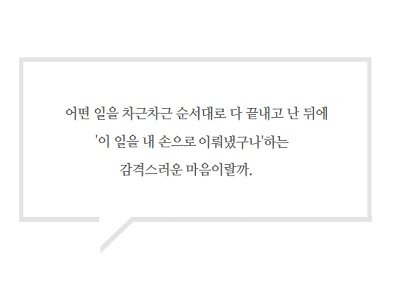
지안이 섬 생활을 해나가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힘들었지만 조명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패널과 발전기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주말농장에 다녔던 경험으로 텃밭에서 채소들을 잘 키워냈다. 수영을 배워서 더 쉽게 물질을 익힐 수 있었다. 요리 실력이 있어야 세상살이를 할 수 있다는 엄마의 지혜 덕분에 즐기며 요리를 해 자신에게, 현주 언니에게 대접할 수 있다.

삶은 단편적으로 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겨울 때도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매 순간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며 흔적이 되어 자신에게 쌓여가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응원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다 처음이라 좌충우돌, 허둥지둥하기도 했지만 섬 생활을 나름 잘 헤쳐나가는 지안이었다. 하지만 심하게 아파 하룻밤을 꼬박 앓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 '자유'에 관한 대목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 모든 일을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지금의 이 현실이 어쩌면 자유의 한 장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자유에는 이렇게나 많은 뜻이 있구나. 오롯이 나 홀로 호젓이 걷는 것도, 고독하게 아프고 쓸쓸히 견디는 것도, 이렇게 하룻밤을 꼬박 앓고 난 뒤 일어서는 일까지도 모두 자유로구나 생각한다.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기꺼이 자신을 감싸안아주는, 그 감동스러운 치유의 시간을 지안의 무인도 생활로 마주할 수 있었다. 글과 그림으로 다정한 위로를, 격려를 건네는 [나의 완벽한 무인도]였다.
잘 가, 잘 살아.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