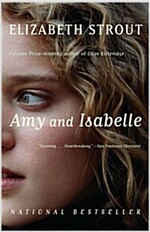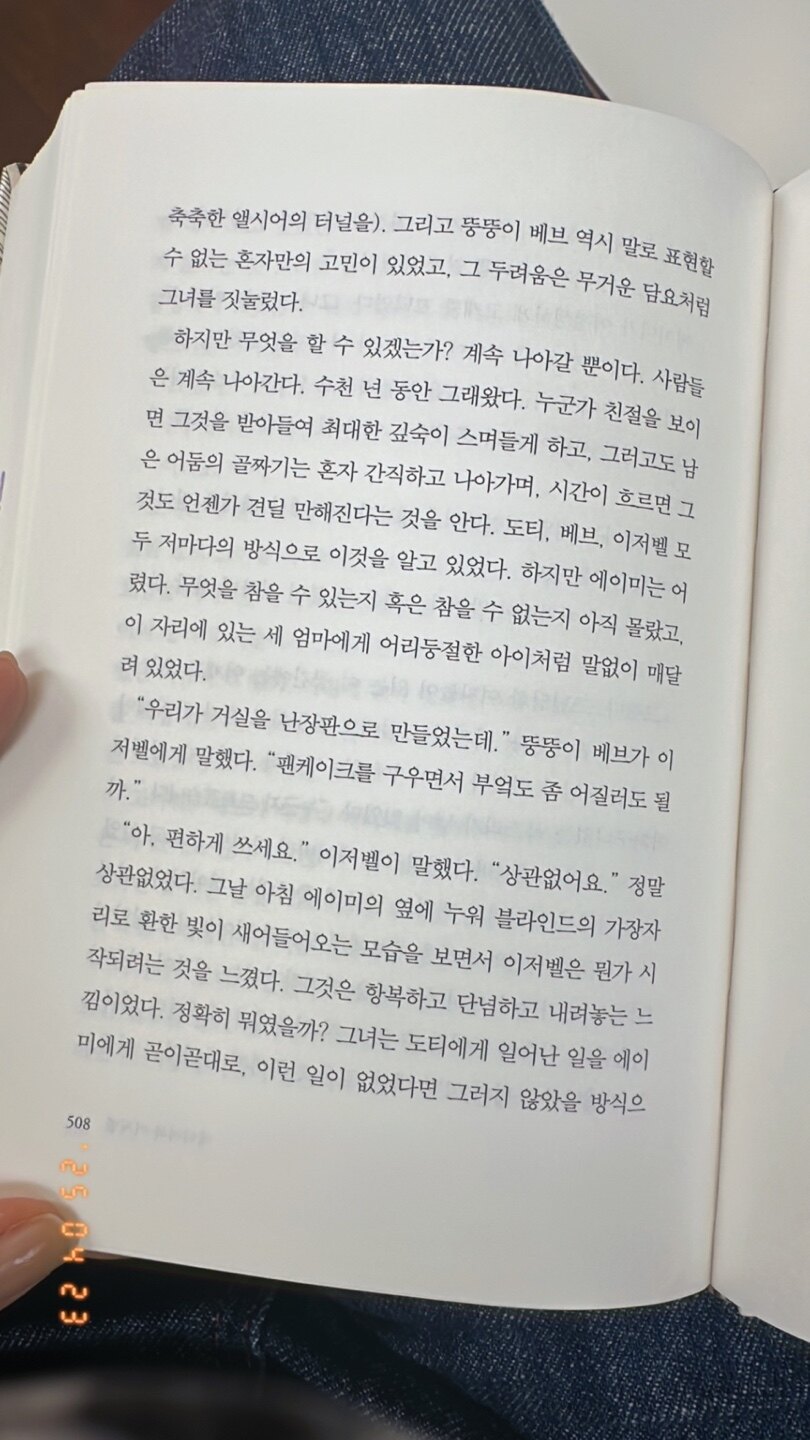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에이미와 이저벨]을 우연히 완독했다. 인생을 미리 알았더라면. Van Halen의 Hot for teacher가 저절로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내 전애인들이 압도적으로 가르치는 직업군에 속해있다는 건, 어쩌면 나 역시 그들의 그 가르치는 행위에 끌렸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다. 허나 나를 가르치려고 들면 항상 짜증냈다. 짜증나면서도 좋아한 구석들이 있기도 했던 거 같고. 엄마와 딸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육체적인 불꽃에 대해서 서술하는 대목들이 꽤 인상 깊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읽은 기 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 겹쳐지기도. 미카엘 하네케의 영화 [피아니스트]도 동시에. 열일곱 에이미가 서술하는 첫키스 장면에서 옛날 고려 시대에 했던 첫키스 기억이 화라락 되살아났다. 그때 나 역시 열일곱이었지만 지금 내 열일곱 딸아이가 누군가와 첫키스를 한다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골이 지끈거린다. 허나 아이와 아이의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동갑내기들이 처녀 딱지를 떼었다고 하니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더 골이 지끈거려지긴 하지만. 여러 면모에서 정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정독은 후에 차차. 중학교를 막 졸업하던 그때 열일곱에 막 들어서던 그때 모파상을 읽고 어쩌면 이다지도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지? 라고 혀를 끌끌 찼으나 수개월이 채 되지 못해 첫키스를 하고난 후 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깊이 매혹될 수밖에 없었다. 버퍼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 버퍼링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동시에 얻게 되는 것들이 있고. 셈법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난 후에야 알 수 있는 거다. 무엇을 잃었는지, 또 무엇을 얻었는지를. 반성은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드높이는 거 아닌가. 이 소설을 읽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에게 깊이 반했다. 카페에서 완독하고난 후 격정적으로 뛰는 심장, 그러니까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박동수가 무려 150회에 능가하는 숫자를 기록하는 걸 가만히 앉아 체크하면서 지금 내가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울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가 보고 싶은 건가? 대체 이게 뭔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나는 왜 그토록 어리석었던 걸까?" 계속 고리에 고리를 거듭 꿰어나가면서 파워에이드 하나를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면서 살살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한 바퀴 뛰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공원까지 산책할 거냐 물어보니 콜.